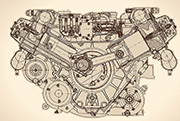하루아침에 세상 모든 도시에서 자동차가 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몇 년 전만 해도 미쳤느냐는 대답이 돌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구가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지 모른다. 이미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이나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를 없앤다는 것은 세계를 멈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만큼 자동차는 인류의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지금처럼 한두 시간짜리 출퇴근이 흔한 세상에서는 직장인들의 출퇴근이 난망해질 것이다. 출퇴근이 안 되면 산업체와 서비스업체는 가동을 멈출 것이고,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인류는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대중교통과 치안과 의료 같은 공공서비스에 쓰이는 자동차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자동차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자동차 없는 도시가 이 세상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도시 전체가 물 위에 지어져 아예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 베네치아의 길은 보행자용 도로뿐이다. 자전거도 다니지 않는다. 자동차 길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바닷물이 출렁이는 운하가 이어져 있다. 때문에 자동차의 역할을 곤돌라나 모터보트가 대신한다. 대중교통을 대신하는 큰 배, 경찰차와 앰뷸런스를 대신하는 보트, 마트에 물건을 실어다주는 소형 바지선 같은 배들도 있다. 쓰레기도 배가 다니며 치운다.

물 위의 도시 베네치아는 아예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
베네치아처럼 차가 없는 도시를 찾아보면 세계 곳곳에 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도시들은 예외이고, 세계 어느 도시에 가보나 온갖 종류의 자동차들로 넘쳐난다. 우리나라만 해도 2018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2,280여만 대로 인구 2.3명 당 차량 1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40%가 서울·경기 지역에 몰려있다고 하니, 자 한번 생각해보자. 중형 자동차의 덩치는 보통 성인 5~6명을 모아놓은 것과 비슷하다. 즉, 서울은 서울 시민이 차지하는 면적보다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더 넓다. 사실상 서울은 시민의 도시가 아니라 자동차의 도시다.
다른 나라의 대도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외국을 다녀보면 나라마다 도시마다 자동차 문화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다녀왔던 이탈리아 로마는 우리나라만큼이나 자동차가 눈에 많이 띄는데 대개는 집 앞에 세워져 있고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유는 모르지만 도로를 주행하는 차보다 길가에 주차한 차가 더 많은 도시는 로마가 처음이었다. 차의 종류는, 주머니에 넣어 가져오고 싶을 정도로 예쁜 디자인의 소형차들이 많이 보였다. 어찌 되었든 로마도 자동차의 도시다.
관광객들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 많이 찾는 캐나다 옐로나이프는 겨울이면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다. 내가 가져간 카메라는 사진을 찍으려고 실외에서 십 분만 들고 있어도 배터리가 얼어 충전하라는 표시가 깜빡였다. 이런 곳에서 차는 어떻게 관리할까.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눈 덮인 밤길을 걸어 숙소로 돌아오는데 택시가 와 섰다. 나는 택시비가 아까워 그냥 가라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비용은 받지 않을 테니 추운데 그냥 타라고 문을 열어줬다. 너무 춥고 차가 드물면, 다른 도시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런 호의와 인심이 생겨나는 걸일까. 옐로나이프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후손들이 자동차 대신에 눈썰매를 타고 눈밭 위를 질주하는 도시다.
뉴욕 맨해튼에 놀러가서 내가 가장 놀랐던 점은 마천루 숲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야경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소장품들도 아니었다. 맨해튼이 차가 잘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고 횡단보도가 많으니 내가 타고 다닌 시내버스는 가다가 서다가를 반복했다. 하지만 교통체증처럼 도로에 차가 많아 버스가 멈춰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나는 맨해튼에 가기 전에 ‘서울보다 큰 도시니까 틀림없이 교통체증도 엄청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다.
내가 다녀본 외국의 도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울만큼 교통체증으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도시는 없었다. 도시에 차가 많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다. 맨해튼이나 로마를 봐도 그렇다. 문제는 서울처럼 그 차들의 다수가 시동을 걸고 도로로 쏟아져 나왔을 때다.
세계의 도시들에 자동차가 그렇게 많건만, 정작 도시의 풍경과 자동차가 잘 어울리는 도시는 드물다. 이상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난 여행을 다닐 때 대부분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고 여행 에세이도 두 권이나 내봤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현대문명을 대표하는 문물이고, 현대의 대도시와 역사를 함께 해왔다. 그런 자동차와 도시의 풍경이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니 언뜻 이해가 되질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작가든 아마추어작가든 사진작가가 찍어 올린 도시 풍경을 한 번 찾아보라. 자동차가 주인공인 사진이 몇 장이나 되는지. 주인공이기는커녕 자동차의 꽁무니도 보이지 않는 도시 풍경 사진들이 대개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현대의 도시들은 대개 자동차와 풍경사진에서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 자동차가 주인공인 사진은 그래서 자동차를 위한 상업광고사진인 경우가 많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서울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다가 나중에 괜찮게 나온 사진을 골라낼 때, 자동차가 나온 사진들은 망쳤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쿠바의 하바나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다. 이 두 도시만은 어째서인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도시 풍경에 자동차가 잘 녹아난다. 클래식 차종이든 첨단유행 차종이든, 깨끗하게 세차했든 흙먼지를 뒤집어썼든, 하바나와 샌프란시스코의 도시엔 자동차가 마치 도로라는 나무줄기에 돋아난 생기 있는 나뭇잎처럼 잘 어울린다.
하바나의 도로와 샌프란시스코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크게 다르다. 하바나에는 올드카라고 불리는 구형 컨버터블이 많고, 샌프란시스코는 최신형의 비싼 자동차가 많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두 도시의 자동차들만큼은 자신의 집, 도시 풍경과 겉돌지 않는다. 사진을 찍으면 다른 도시의 자동차들보다 훨씬 근사하게 나오며 도시 풍경과 잘 맞물려 멋진 조화를 이룬다.

쿠바 하바나는 오래된 올드카가 도시 풍경 속에 잘 녹아 있다
- 백민석
- 소설가, 단편집『 16믿거나말거나박물지』『 장원의 심부름꾼 소년』장편소설『 헤이, 우리 소풍 간다』『 공포의 세기』